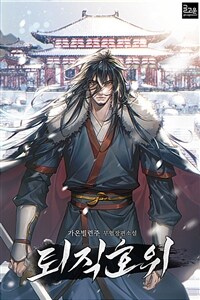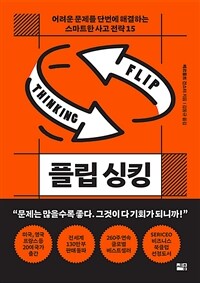컨텐츠상세보기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오사와 마사치 지음, 김효진 옮김
- 출판사오월의봄
- 출판일2015-10-25
- 등록일2015-11-30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30 M
- 지원기기
PC프로그램 수동설치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PC
책소개
파국 이후를 헤쳐가는 ‘책’의 힘
“인생은 유한하다. 읽고, 생각하고, 쓰라”
30년 넘게 독서-사고-집필을 업으로 해온 베테랑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가 안내하는 ‘생각하는 책읽기’의 세계
이 책은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가 펼쳐 보이는 ‘생각하는 책읽기’의 세계를 담고 있다. 오사와 마사치는 30년 넘게 독서-사고-집필을 업으로 해왔고, 읽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 그런 저자가 사회과학, 문학, 자연과학 분야의 명저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어가며, 독창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사고의 전개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준다. 여러 분야와 주제들을 과감하게 횡단하는 사이, 책을 통해 제대로 사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파국’ 이후에 놓인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의식과 그것을 받아안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을 비로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의 힘’
저자는 인간은 그냥 놔뒀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철저한 탐구, 생각하고자 하는 욕망, 한없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생각하기와 알기를 멈추거나, 때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한다. 들뢰즈는 그런 인간을 굳이 생각하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오는 쇼크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쇼크를 ‘불법침입’에 비유했다. 그것은 3·11 동일본 대지진 및 핵사고, 4·16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희대의 대형참사일 수도 있고, 작게는 이해할 수 없는 주변인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불법침입자’는 다름 아닌 ‘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분야이건 훌륭한 책들은, 평소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인간을 비로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다만 책에 답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통해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책의 힘》에서 저자는 그 방법을 실제 책읽기 과정을 통해 생중계로 보여준다. 독자가 아직 읽어보지 않은 저작을 다루고 있더라도 저자의 해설과 안내에 따라 충분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책 안의 사유를 통해서 자기 고유의 사유를 발전시켜나가는 하나의 모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각각의 책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꿰어나가는 솜씨에 감탄하게 되며, 각각의 장이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지만 다 읽고 났을 때는 분야를 넘어 커다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것도 이 책의 큰 매력이다.
생각하는 것도 기술이다
본격적으로 책읽기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생각한다는 것’의 원론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생각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듯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분명한 절차하에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성취’해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 무엇을 사고하는가’에서는 각자의 인생에서 주요하게 사고해야 할 단기 테마, 장기 테마를 찾아내고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2. 언제 사고하는가’에서는 동시대의 사건들과 공진하면서 사태의 한복판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것, 반복되는 사건들을 주목해 거기서 사고를 끌어내고, 기존 이론을 자기가 사고할 때 쓰는 언어로 변환해야만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3. 어디에서 사고하는가’에서는 신체와 약간 떨어진 허공 어딘가에 있는 듯한 아이디어를 붙잡아서 언어화하는 방법―종이 위에 구체적인 메모 작성, 실제로 말해보고 특정 대상에게 말하듯이 쓰기―을 알려주며, ‘4. 어떻게 사고하는가’에서는 생각의 전개도에 ‘보조선’ 그려넣기 등 관계없어 보이는 이 사실과 저 사실을 관계지으면서 독창적인 사고를 끌어내는 방법, 비약과 착실함의 조화, 감정의 논리정연함 등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으로 ‘5. 왜 사고하는가’에서는 사고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타자와의 조우이자 대화이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이나 글로 남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책을 아주 나중에 읽게 될지도 모를 미래의 타자를 향한 것임을 강조한다.
사회과학, 문학, 자연과학…… 광활한 책읽기와 파국 이후의 인간
저자는 생각하는 기술의 원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책읽기 시뮬레이션에 들어간다. 1장 ‘사회과학,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에서는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비롯한 다섯 가지 저작을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관통시켜 읽어낸다. 2장 ‘문학,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에서는 이언 매큐언의 《속죄》를 비롯한 다섯 가지 저작을 ‘죄’라는 키워드로 읽어낸다. 3장 ‘자연과학,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에서는 리처드 파인만의 《빛과 물질의 신비한 이론》을 비롯한 일곱 가지 저작을 ‘신’이라는 키워드로 읽어낸다.
1장에서는 ‘시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죽고, 인생은 필연적으로 미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며, ‘시간’에 대한 특정한 관념을 전제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거쳐가면서 ‘시간’의 관념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여 사뭇 다른 결론을 끌어낸다.
2장에서는 인간에게 죄란 무엇인지, 그 반대편의 윤리적 행위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는 속죄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여러 소설들에서 ‘죄’를 둘러싸고 나타난 다양한 양상―뒤늦음의 죄, 인류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되는 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죄, 속죄가 불가능한 소설가 즉 신의 죄, 속죄받기를 오히려 두려워해 저지르는 구세주 살해―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숨 막히게 펼쳐진다.
3장에서는 뛰어난 수학과 물리학 저작들을 참고로, 과학과 현대 철학이 제기하는 우주관의 중심적인 함의를 이끌어낸다. “멀리 떨어진 복수의 물체 사이에 어떻게 힘이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중력의 수수께끼, 기계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제1원인 즉 신을 상정해 마술적인 원격작용을 계승한 뉴턴이 근대과학의 기초를 쌓았다는 역설, 그러나 이러한 고전물리학을 완전히 뒤집는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양자역학, 신의 존재와 관계없이 물질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기묘한 세계, 신에게 지각되지 않는 한에서 있는 존재 이전의 새로운 <존재>,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유물론과 무신론…… 자연과학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저자의 재기 넘치는 안내에 따라 과학과 철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사고의 롤러코스터를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분야를 횡단하는 광활하고 지독한 책읽기에는 다름 아닌 ‘파국(끝)’에 대한 사유가 깔려 있다. (특히 ‘3월 11일의 사건’―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 저자를 이러한 작업으로 이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은 파국에 맞서서 ‘읽는다’는 것, 끝 이후에도 좀처럼 끝이 나지 않는 지독하고 이상한 시대에 내버려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책의 힘’에서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저자는 인간의 죄와 유한성 등 한계를 직시 및 탐구하고,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신과 진리에 대한 전복적인 사고를 감행한다. 결국 이 책은 세계를 재구성해내고 파국 이후를 살아갈, 강력한 ‘책 읽는 인간’의 상을 그려내 보이고 있다.
날마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당신을 위한 책
책읽기 횡단을 마친 뒤에 ‘나가는 글’에서 저자는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고는 쓰기에서 성취를 거둔다. 사고한다는 것의 최종 국면은 쓴다는 것과 완전히 한몸이다. 쓰기로 수렴하지 않으면 사고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래서 논문, 저서, 에세이 등 집필 의뢰를 받을 때부터 그게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 본인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의뢰받았다고 전부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집필 전 자료조사·현지조사 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사진이 될 메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쓰기 직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작하지 말아야 할 글쓰기는 어떤 것인지, 쓰는 중의 식사 등 생활습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편집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교정과 마감의 효용은 어떤 것인지……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글쟁이의 사생활 전반을 속속들이 만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을 하는 수많은 독자들을 위한 아주 사려 깊으면서도 직설적인 가이드로 추천할 만하다.
저자소개
1958년생. 도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바(千葉)대학 문학부 조교수, 교토대학 대학원 인간 ·환경학 연구과 교수 역임. 저서로 《허구 시대의 끝》《문명 내 충돌》《불가능성의 시대》《내셔널리즘의 유래》(2007년 마이니치출판문화상)《‘세계사’의 철학》《자유라는 감옥》(2015년 가와이하야오학예상) 등이 있으며 공저서도 다수이다.일본 사회학의 거두 미타 무네스케(필명 마키 유스케)의 직계 제자로서, 90년대 오타쿠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 옴진리교에 의한 사린가스 테러 사건 등 세간을 들썩이게 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명쾌하고도 독창적인 분석을 선보이며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로 부상했다. 탈냉전 체제의 세계, 일본의 전후 사회 등을 배경으로, 자유, 정의, 내셔널리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위험사회론 등의 굵직굵직한 주제를 거침없는 필치로 다뤄왔다. 특히 2009년 교수직 사임이라는 개인적 사건과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는 재앙적 사건 이후에는 기존 사회 이론이 봉착한 한계를 첨예하게 인식하고, 더욱 과감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통의 문예지 《군조(群像)》에 연재 중인 대형 기획 《‘세계사’의 철학》(현재 네 권이 출간되었다)이나, 직접 선정한 특집으로 펴내는 개인 무크지 《THINKING ‘0’》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군조》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사상지 《현대사상(現代思想)》의 주요 필진으로 활약하며 사회 이론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유물론’을 주창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일본어판 《사고술(思考術)》은 2013년 말에 출간되어 천편일률적인 독후감이 아닌 ‘책 읽기에서 독창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법’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큰 반향을 얻었고, 2014년에는 이에 힘입어 후속작 격인 《‘질문’의 독서술》이 출간되기도 했다.
목차
서문 5
들어가는 글 - 생각한다는 것
1. 무엇을 사고하는가 12
2. 언제 사고하는가 17
3. 어디에서 사고하는가 26
4. 어떻게 사고하는가 35
5. 왜 사고하는가 44
보론 - 사상의 불법침입자 50
1장 사회과학,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
1. 마키 유스케의 《시간의 비교사회학》을 읽다 65
2.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다 87
3.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읽다 104
4. 에른스트 칸토로비치의 《왕의 두 신체》를 읽다 115
5.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다 124
2장 문학,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
1.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을 읽다 149
2.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다 164
3. 아카사카 마리의 《도쿄 프리즌》을 읽다 175
4. 이언 매큐언의 《속죄》를 읽다 192
5. 필립 클로델의 《브로덱의 보고서》를 읽다 206
3장 자연과학,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
1. 수학과 인생
요시다 요이치의 《0의 발견》을 읽다 231
가스가 마사히토의 《100년의 난제는 어떻게 풀렸을까》를 읽다 236
2. 중력의 발견
오구리 히로시의 《중력이란 무엇인가》를 읽다 251
빅토르 I. 스토이치타의 《회화의 자의식》을 읽다 257
야마모토 요시타카의 《자력과 중력의 발견》을 읽다 263
3. 양자역학의 형이상학과 진정한 유물론
리처드 파인만의 《빛과 물질의 신비한 이론》과 브라이언 그린의 《엘러건트 유니버스》를 읽다 272
나가는 글 - 그리고, 쓴다는 것 289
후기 317
옮긴이의 말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