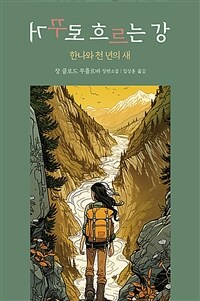컨텐츠상세보기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서자영
- 출판사낭추
- 출판일2020-08-31
- 등록일2021-03-03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16 M
- 지원기기
PCPHONE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책소개
* 책 속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여기는 이성계 장군님의 넷째와 다섯째 아드님이신 이방간, 이방원. 이쪽은 사부님들의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한로요.”
“반갑소, 나는 이직이오.”
인사를 하는 사이, 사내들 사이에선 으레 그러하듯 상대를 훑어보며 가늠하는 시선들이 빠르게 오갔다. 웃으며 서로 손을 마주잡은 채 입으로는 반갑네 어쩌네 지껄이고 있지만, 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하고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오가느라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이게 뭐야,”
숨이 넘어가게 깔깔거리는 자경의 발랄한 웃음소리 덕분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자경은 방간의 옷을 손가락질 하며 웃어댔고, 무질이 무안한 얼굴로 옆에서 제 누이를 열심히 말렸다.
“어디 산에서 방금 내려왔나?”
어찌나 웃었는지 눈꼬리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단 자경이 방간의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방간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저 위에선 이리 입고 다녀?”
우연히 스치듯 지나쳤어도 돌아봤을 법한, 눈에 확 띌 정도로 예쁜 계집애가 저를 대놓고 놀리는데 어느 사내가 부끄럽지 않으랴.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자경 때문에 애써 참고 있던 다른 녀석들까지도 피식피식 웃기 시작한다는 거였다. 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평생 놀림감이 될 게 분명했다. 방간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써가면서 애를 썼지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원래 잘 쓰지 않던 머리라서인지 쉽지 않았다.
“위에선 이리 입습니다. 함주는 개경과 달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우니까요.”
그때 뒤에 서 있던 방원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앞에 나서며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함주처럼 척박한 곳에서 의복은 사치스럽게 몸을 꾸미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가죽과 짐승의 털을 이리 이용할 밖에요.”
낮고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자경이 흥미로운 시선으로 방원을 보다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방원이 움찔했다.
“내가 기억나지 않아?”
저를 보며 빙긋 웃는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어렸을 적 말을 태워주랴, 물었던 당돌하면서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예뻤던 계집애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의 자경에게서 그 어린 여자애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허나, 그 이야기를 즐거이 나누기엔 상황이 적절치 못했다.
“왜 하대하십니까?”
“뭐?”
“처음 보는데, 서로 통성명도 안하고 인사도 안했는데, 어찌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를 하시냔 말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까.”
“방원아!”
미간을 찌푸린 채 다다다다 쏘아대는 어투에 놀란 방간이 방원의 팔을 다급히 붙잡았다. 낯선 모습이었다. 형제간의 서열관계가 확실해서 감히 형들에게 덤빌 수 없는 분위기임에도 방간이 때로 형들에게 뻗대기도 하고 대거리하기도 하는 반면, 방원은 제법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주 분한 얼굴로 돌아서거나 서러워서 울지언정 이리 따박따박 따진 적은 없었다. 공부를 가르치던 스승들이 방원의 입이 제법 맵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아는 방원은 처음 보는 상대에게 심지어 여자에게 이럴 성격은 아니었다. 거기다 낯가림이 있어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방원이 아니었던가.
“나는 이 집 셋째 딸 민자경이다. 너는 이성계 장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아니냐? 우린 몇 해 전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어 반가워서 아는 체를 한 건데 그게 그리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많으니 하대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두 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존대를 하랴?”
“두 살이 어린 제게만 하대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형님에게도 처음 보자마자 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괜찮다.”
방간이 급히 나서서 손을 내저었다.
“보아하니 또래인 거 같은데, 서로 하대하는 게 편하지, 뭐.”
“형님!”
발끈한 방원이 원망스럽게 방간을 노려보았다.
“그렇잖냐.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불편하게 뭔 존대야.”
방간을 노려보다 이를 악문 방원이 몸을 돌렸다.
“형님은 그렇다 해도 저는 싫습니다.”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공부를 하러 온 것이지 시답잖게 어울리며 쓸데없는 짓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눈앞에 서 있는 이 계집애에겐 더더욱 그리 보이고 싶지 않았다.